국제 언론은 비상계엄령의 배경으로 최근 한국 사회의 정치적 긴장과 사회적 갈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 사회적 양극화, 그리고 급격한 정치적 변화에 대한 우려가 보도의 주요 논조였습니다.
국제 언론의 보도는 대체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옹호하는 관점에서 비상계엄령을 비판적으로 조명했습니다. 동시에 상황의 복잡성과 맥락을 이해하려는 균형 잡힌 접근도 함께 시도되었습니다.
국제 언론의 보도 내용에 따른 시각
서구 언론들은 대체로 강경한 비판적 논조를 취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를 강조하며 근본적인 인권 침해 관점에서 접근했고,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아시아 지역 언론인 일본의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의 정치적 맥락을 고려하면서도, 민주주의적 원칙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비난보다는 상황의 복합성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중국 언론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립적이면서도 미묘한 논조를 유지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 같은 매체는 한국의 내부 정치적 상황을 지정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며, 직접적인 비판보다는 상황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취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각 언론의 논조가 해당 국가의 정치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구 언론은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고, 아시아 언론은 문화적 맥락과 정치적 안정성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BBC, CNN과 같은 글로벌 미디어는 비교적 균형 잡힌 접근을 시도하며 비상계엄령의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면서도, 한국 사회의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려 노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정리한 한국의 계엄령.

유엔(UN, United Nations)

…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흐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해제한 것을 환영한다고 대변인이 말했으며, 그는 상황을 “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변인 스테판 뒤자릭은 기자 회견에서 단기간 시행된 계엄령을 “수 시간 동안 많은 혼란이 있었다”라고 묘사하면서도 구테흐스가 상황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자릭은 “사무총장이 계엄령 철회를 환영하며 상황을 계속 자세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미국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블링컨 국무장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의 비상계엄령이 “동맹국 간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민주주의 후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대해 즉각적인 계엄령 해제와 민주적 절차 준수를 요구했으며, 필요한 경우 외교적, 경제적 제재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럽연합(EU,European Union)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한국 정부에 대해 “법치주의와 인권 존중”을 촉구하며, EU 회원국들의 공동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EU는 국제인권감시기구의 한국 상황 조사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더 신중했습니다. 일본은 외무성을 통해 “한국의 내부 상황에 대한 우려와 조속한 안정 회복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고, 중국은 “한국의 주권적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더욱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와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공동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의 비상계엄령이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규정하고, 국제사법재판소(ICC)에 공식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 같은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은 미국에 이어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고, 호주 또한 외교적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민주적 절차 존중을 요구했습니다.
아프리카연합(AU)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유보적이었습니다. 이들 지역은 자국의 정치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상황을 좀 더 복합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단순한 성명 발표를 넘어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UN 인권이사회에 공식 조사를 요청했고, 국제인권연맹은 한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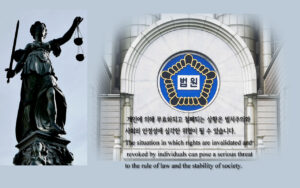

More Stories
세상에는 나밖에 없다. ‘탐욕(贪欲)으로 시작한 비상계엄’
어리석은 법조인(法曹人)에게 권력이 생길 때 발생하는 ‘2025년 현실 …’
사회적 분열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 사회, 원인은 ‘정치적 이념’